깔깔유머방
이국종 교수님 현재 건강상태코멘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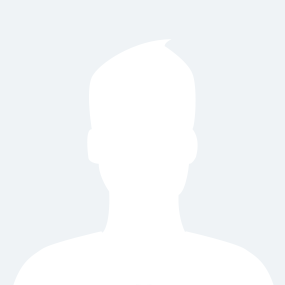
사과사랑
조회1617

현재 건강상태:
오른쪽 어깨: 세월호 현장에서 부러짐
왼쪽 무릎: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꺾임
왼쪽 눈: 거의 실명 (2년 전), 오른쪽 눈도 발병 가능성 있음
36시간 일하고 잠깐 눈붙이고 36시간 다시 일하는 일정으로 수년째 일해오고 있음
잠은 병원에 간이침대를 놓고 자고 집에는 거의 못들어감
동료 한 명은 1년에 4번 집에 들어갔다고 함.
우리나라는 사망환자 리뷰라는 것도 없어서 데이터도 부족하고,
교수님 노력 덕에 일명 이국종법이 2012년에 발효됐지만
응급환자 1명을 받으나 100명을 받으나 똑같이 지원금을 받아서
대학병원들은 최대한 일반 환자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응급환자 기피하고
병원마다 외상센터는 골칫덩이 취급 받고
이국종 교수님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시기질투받고
괜히 문제 만든다는 식의 시선으로 따돌림 받고 해임 위기도 몇 차례나 겪는 등 견제가 장난 아니라고 함
이제 지쳐서 더 못버티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감
한 사람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지워져있고
제도는 개선될 여지가 안보이고
응급외상센터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라 정말 죽음에도 계급이 있는게 맞는 상황인데
진짜 순수하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는 원칙 가진 의사는 따돌림 당함

이국종 교수 “기대도 희망도 없지만, 원칙 버리진 않겠다”
최종수정 2017-10-13 21:06
1년에 200번을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고, 정 위급할 땐 헬기 안에서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주무르며 저승의 문턱까지 간 환자의 생명을 구해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오른쪽 어깨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갔다가 부러졌고, 왼쪽 무릎은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꺾여서 다쳤다. 왼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된 건 2년 전 직원건강검진에서 발견했다.
그에게 쏟아지는 ‘최고’ ‘유일’ ‘영웅’이라는 찬사는 그를 질시하는 이들에 의해 종종 독 묻은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고, 그가 힘겹게 따낸 제도의 성과는 잇속을 차리려는 이들의 잔칫상에 공출된다. 이국종(48)은 ‘홀로 우뚝 선 영웅’이 되기를 바란 적이 결코 없었으나, 세상은 그를 고립된 링 안에 밀어 넣고 슈퍼맨 같은 투혼을 발휘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 잔인한 짓이다.
환자에게 달려갔다 올 때마다 그는 전투를 치르고 터덜터덜 막사로 돌아오는 병사처럼 지쳐갔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카리스마’의 갑옷을 벗었을 때, 이국종의 맨얼굴은 폭풍우에 휘달리는 섬세한 꽃잎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주말도 휴일도 없이 36시간 연속으로 밤새워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36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생활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가 틈틈이 메모해온 비망록엔 숱한 좌절과 절망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미국 연수 때 지켜본 응급의료체계 모든 단계 유기적 연결, 환자 살려내
한국에도 세계적 외상센터 꿈꿨으나 병원에선 적자내는 ‘골칫덩이’ 취급
주변에선 노골적으로 견제 나서기도
-헬기로 환자 이송하는 걸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니 왠지 울컥했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한테 잘못 오신 것 같아요.”
그가 내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황스러웠다.
-왜요? 기를 쓰고 살려내려는 분들을 보니 생명에 대해서 경외감도 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생명을 살리네 어쩌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이 일을 하루도 못 하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녜요? 의사가 헬기 동승하는 거, 의료보험 수가 10원도 안 잡혀요. 저희는 성과급도 거의 없어요. 의료보험 적자 난다고 월급이 깎이기도 하고요. 전 그냥 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뭘 모르는데요?
“제가 이 정도인 걸 모르시고, 너무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도 쓰레기, 안에서도 쓰레기. 다들 절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시끄럽다고. 나만 없으면 ‘에브리바디 해피’한데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요.”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의 말엔 냉소와 자괴감, 분노와 절망감이 뒤얽혀 있어서 단방에 진심을 읽어내기 어려웠다.
내가 버릴 수 없는 마지막 원칙
아버지는 한국전 직후 지뢰 파편이 망막에 박히면서 왼쪽 눈을 실명했다. 대학을 졸업한 인텔리였지만 전쟁에 젊음을 바친 아버지는 마땅히 세상에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다.
-생존해 계신가요?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국제공항 경리부에 어렵사리 자리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주차비 받아서 빼돌리는 걸 눈감아 주지 못하셨죠. 그 일 때문에 김해로 좌천되니까 더럽다고 때려치웠어요.”
-진짜 아버님을 빼닮으셨나 봐요.(웃음) 의사가 되겠단 생각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노란색 의료카드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병원에 가면 ‘왜 여기까지 왔냐?’고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죠. 그때 동네에 ‘김학산 외과’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절 냉대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부담금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제게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의사가 되면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외상외과 의사로 일한 지 15년인데, 그간 개인적으론 잃은 게 많으시죠?
“한국 사회 막장을 다 본 것 같아요. 내가 깜냥에 안 맞는 일을 벌여 우리 센터 동료들까지 사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서른여섯 시간씩 밤새워서 근무를 하면 집엔 언제 가세요?
“같이 일하는 정경원 선생은 1년에 네 번밖에 집에 못 간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건강도 사생활도 희생해 가면서.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걸 알지만 가망이 없어요. 고쳐질 수도 없고 제가 고칠 수도 없어요.”
올해는 사직자가 한 명 있고 정경원 선생도 미국 연수중이라 더욱 여유가 없다고 했다. 간혹 즐기던 밴드 활동도 접은 지 오래다.
-외상외과 의사 15년간 얻은 건 뭔가요?
“악명? 독불장군이다. 막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덕에.
“…….”
그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침묵했다.
-떠날 생각도 해보셨나요?
“수없이 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사우디에 파견의사 보낸다고 할 때도 지원해서 뽑혔는데 국가적으로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면서 어그러졌어요.”
-그래 봤자 가난한 사람들 죽고 다치는 현장에서 크게 못 벗어나시는군요.(웃음)
“왜요. 레이저로 점 뽑는 것도 잘해요.(웃음) 하나 뽑는 덴 만원, 열세 개 뽑으면 십만원.”
-선생님 하시면 제가 빼러 갈게요.(웃음)
표정 없던 그가 허탈하게 웃었다. 나도 웃었다. 가슴엔 분노인지 허무인지 모를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다시 여쭤도 될까요? 그간 얻은 게 뭔지?
“(잠시 침묵) 동료들이요. 바보처럼 순박하고 사심 없는 사람들. 집에도 못 가고 환자한테만 매달려온 정경원 선생, 캐나다 간호사 취업도 팽개친 김지영 선생, 지치지 않고 대안을 찾아보는 허윤정 전문위원, 위험한 일에 늘 앞장서는 소방헬기 파일럿들. 이성호, 이세형, 이인붕, 박정혁, 석회성 기장….”
이국종은 클립으로 곱게 묶어놓은 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외롭고 막막할 때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뒤적여 보는 모양이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원칙’은 뭐예요?
“의사고 뭐고,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원칙이라면… ‘진정성’이요. 진심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새벽 4시5분, 그는 칼에 찔린 환자가 왔다는 콜을 받고 급히 일어났다. 그와 인사를 짧게 나누고 건물을 나섰다. 바깥은 짙은 어둠, 서늘한 바람이 이마를 스쳤지만 가슴은 여전히 먹먹하기만 했다.
나는 외상외과 의사였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업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꾸 내 눈앞에서 죽어나갔다.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선 전장이 홀로 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할 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이국종 비망록 중에서)
무료 전문가 방송
1/3
최근 방문 게시판
실시간 베스트글
베스트 댓글
-
전과 4범은 절데로 대텅하면 안된다고 본다. 감방으로, 감옥으로.. 법인카?? 선거비?로 쇠고기 먹으며 눈이 스르르 감기는 넘...;
거래소시황이재명 대통령 되기 위한 정치를 이제 합니다!
-
나쁘게 방송하면 경고 벌칙금 ,,,
거래소시황경제위기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
-
금투세 미친 인간들이 만들은 것이지. 주식시장 죽이고 뭔 금투세를 받겠다고 극서도 1% 부자에게만 받는 것이라고 설래발 하여튼 좌파인간들은 나라 망가트리는데 일등공신
거래소시황매도-앞으로 4년간은 죽었다고 복창 해라,,,
-
뿌린대로 거두리라 이 씨바랄 좃붕신ㅋㅋ
ELW토론아 오늘
-
추바리 정신 병자...쎌트리온도 딸랑 몇주 가지고 있을 듯....심리를 보면......ㅋㅋㅋ
거래소시황결론적으로

0/1000 byte